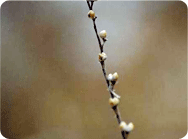황하….
꿈에도 가본적 없던 곳이지만, ‘황하’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고 내안의 친근함으로 다가오는건 학창지설 소지로의 ‘대황하’라는 음악을 통한 만남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음악으로 만났던 황하는 밝고 환한곳을 향해 굽이굽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물길을 잃고 까마득해지고는 망설임과 머뭇거림으로 주저하다 다시 그 흐름을 찾아 장대히 흘러가는 듯 하였다.
마치 황하가 실어다준 비옥한 토양들이 황하문명이라는 찬란함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가, 황하의 범람으로 수많은 과거가, 그 존재들이 사라지기도 하였으나 또한 여전히 그 숱한 세월들을 싣고 유유히 흘러가듯이 말이다.
河南省 약초답사를 떠나는길.
하남성에서 주로 많이 보게될 신이, 현호색, 산약, 우슬, 국화, 백지등에 관한 사전자료를 준비해두긴 하였지만, 하남성에 도착할 때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주 관심사는 懷慶지방의 지황을 제대로 보고오는 일이었다.
그 곳의 지황재배지 환경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있는 지황(Rehmannia glutinosa)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눈으로 입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지황에 대해서는 뭔가 끝장을 보리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 지황을 만나러 가는 길 어디쯤에 아마도 황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省都인 鄭州를 중심으로 豫라 부르기도 하는 하남성은 豫州에 속해 九州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中州 또는 중원이라 일컬어지는데 중국의 역사문화가 시작되는 商代(은나라)유적지가 발견된 바로 이곳으로 부터 저 거대한 중원문화가 시작된다.
武陟으로 가는 봉고차 안은 오늘 보게될 약재들의 기원과 성상의 구별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정주에서 서북방향에 위치한 懷慶지방 또는 懷慶府라 일컬어지는 곳으로 心陽, 溫縣, 武陟, 修武, 博愛를 아우르는 5000Km가 넘는 거대한 황하의 중하류를 끼고 있는 역사적인 古都들이다. 이곳 懷慶지방에는 4대 약재라 하여 회경지방의 懷를 그 이름앞에 두어 懷牛膝, 懷山藥, 懷
地黃, 懷菊花에 대한 재배와 연구가 할발하다한다.
누런 황톳물이 넘실대며 흘러가는 장관에 우리 일행은 지나가던 大橋위에다가 홀리듯이 그만 차를 세우고 만다. 비옥한 황토지를 이루며, 중국 문명의 발생지가 된 황허강의 쿨렁이며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태고의 울림과도 같이 내 심장의 고동을 자극한다. ‘물 1말에 진흙이 6되’ 라는 황하강은 말 그대로 황톳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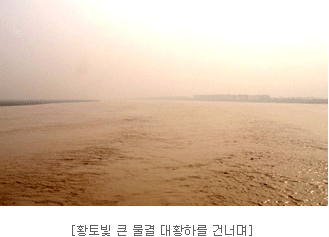
황허의 물로 적셔진 비옥한 황토땅을 黃地라 한다면 黃泉의 기운을 그 뿌리에 가득 담아올렸다 하여 地黃이라 일컫는다는 지황의 이름은 또 이곳에 얼마나 어울림직한 말인지….
황허강이 실어다 주는 비옥한 땅을 댓가로 이곳은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가뭄과 화하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곳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는법. 모두가 좋기만 하고 또 모두가 나쁘기만 한 것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으리라.
무척시 과학기술위원회 앞에서 차는 멈춘다.
마치 유람객과도 같은 우리들의 복장이나 용모가 무색하게, 입구부터 미리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십수명의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고, 닦고, 광을 내신 모습들이 방문객들이 드문 이곳을 찾은 객들에 대한 배려와 호기심, 기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하다.
방으로 들어서니 탁자위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를 손님들을 위해 미리 차려놓은 다과들이 한상 그득하다.
그중에서 유독 우리들의 눈길을 잡아 끄는 코카콜라병.
차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 탄산음료로 손님들을 접대하는 양이 어째 어색하다.
권하기에 맛을 보니, 이건 톡쏘는 콜라맛과 뭔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병의 모양이나 내용물의 색이 영락없이 콜라이며 맛까지 은근히 콜라맛을 흉내낸 이것은 이곳 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황음료이다.
나중에 식당에 가서 또한번 우리를 감탄시켰던 것이 지역 특산 약재인 지황뿌리, 잎, 산약,국화등을 재료로 해서 만든 갖가지 요리들이었는데 지역의 약재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이들의 노력들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준비되어져있던 지황에 관한 연구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고난뒤, 회경지방의 지황과, 산약, 우슬의 형태와 맛을 본다.
이곳의 특등품 지황은 크기가 어른들 주먹만하다. 단면을 잘라보니 미황색의 국화꽃 문양이 선명하다. 한번 쪄서 말린 건지황의 단면은 오랫동안 고은 교이와 같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가득차있다. 이 상태로 두어도 잘 상하지 않는다는데 단맛이 강해 그렇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조한 산약의 형태는 설날 뽑는 떡가래 같기도 하고, 굵은 엿가락 같기도 하다.
이것은 光산약이라는 것으로 이곳 懷山藥을 물에 담가 약간 가열한다음 목판위에 놓고 돌돌 문지르면서 건조기킨 것이다.
회우슬은 마치 황기와 같이 뿌리가 곧고 곁가지가 없으며 육이 충실한데 우슬의 쓰고 신맛을 각오하고, 뿌리를 조금 잘라 맛을 보니 의외로 고소하고 단맛이 입안에 남는다.
이곳의 기술자?학자?중의사분들과 우리 일행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로 이곳 4대 약재들의 재배현황, 생산기술, 가공현황 등등에 관한 실정과 연구정도, 그리고 임상효과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계속 되는 이야기들은 아마 그 끝을 찾기가 힘들 것 같다.
오후에 재배지를 둘러보아야 할 일정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재배지로 가는 길가 도로에는 주황색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다름아닌 옥수수알들.. 이렇게 길가에 내다 널어놓은 옥수수들은 주로 동물들의 사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온 가족들이 모두나와 옥수수 낱알을 털고, 널어 놓은 옥수수알들을 뒤집고, 또 때로는 우두커니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들이 정겹다.
이곳 사람들은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으로 우리를 대한다.
재배지에 도착…
지황밭이라고 도착한 곳인데 멀리서 봐서는 배추밭으로 알아볼 만큼 지황잎이 크고 무성하다.
우리나라 지황밭의 마치 땅에 바짝 엎드려 포폭을 하고있는 듯한 형상과는 영 딴판이다.
국산 지황의 잎이 작고 두터우며 솜털이 보송보송 묻어있다면, 이곳의 지황잎은 우선 크기가 크고, 두께가 얇으며 솜털이 적다.
뒷면은 붉은 자색을 띄고 있으나 잎맥에는 별로 붉은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뿌리를 캐어보니 역시나 어른 주먹만한 놈이 마치 고구마처럼 하나 달랑 달려있는데 국산 지황을 한 뿌리 캐어본 사람이라면 으레히 길쭉한 지황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을것이라 짐작하고 캐어보았다가 그 모양새를 보고는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한 덩어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될 것 같다.
우슬은 지상부의 생김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줄기 마디 부분이 툭 불거져 나오며 아주 붉은 선홍빛을 띄고 있는 것이 牛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걸맞게 느껴질수가 없다.
뿌리부분은 역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 샘플과 같은 형태로 마치 황기와 같이 죽 죽 뻗은 직근의 형태이다.
한 때 잠시동안은 중국의 회우슬이 국산 황기로 둔갑하여 유통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때만해도 우리나라의 우슬뿌리만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나는 ‘무슨.. 아무리 약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지만 그렇게 형태가 다른걸 어찌 분별을 못할까..’ 속으로 혀를 찼더니만. 회우슬의 모양새를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산약과 국화재배지 까지 둘러보고 돌아오는길의 차안은 방금 본 약재들을 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기원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논쟁이 한창인데 지황은 워낙 국산 지황과 달라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우슬 하나만은 제대로 봤다는 생각에 모두들 득의양양이다.
補肝腎?强筋骨 하는 작용을 갖기위해서는 川우슬(Cyathula officinallis)이나 土우슬(국산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보다는 두껍고 肉이 많으며, 그 맛을 보면 단맛이 입안에 감도는 회우슬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리라는 의견에선 모두 만장일치를 보았다.
차는 어느새 시골장의 한 가운데를 헤치면서 지나고 있는 중이다.
갖가지 난전에는 과일이며 채소,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들까지 총동원이고,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국수(?)차앞의 길게 이어진 걸상에는 국수그릇에 고개를 박고있는 손님들로 만원이다.
구두수선, 이발난전 까지 있더니 급기야는 치과까지 난전을 벌여놓았다.
난전 치과라고 해야 의자 하나에 희안한 기구들이 널려있는 펼쳐놓은 가방하나, 그리고 이뽑는 사람과 이를 뽑기위해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하늘을 향해 있는대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뽑힐 사람이면 끝이다.
모두들 여전히 차내토론이 한창들이고, 달리는 차안이라 카메라 셔터도 마음대로 눌러대지 못하는 내 마음만 애닮다.
이튿날..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오늘은 소림사를 둘러싸고 있는 嵩山에서 약초꾼들을 만나 爬山을 해보려 하였건만..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소림사에 가까워질수록 빗줄기가 거세지고. 이런날은 파산이 아니라 관광도 힘들겠다.
하릴없이 소림사 부도탑림과 경내를 둘러보고, 아쉬운 마음에 소림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 秘方(주로 타박상과 골절상을 다루려나?)들이 실린 책이라도 혹여 있으려나 기대해보았지만 기념품 가게는 줄을 이어 섰어도 서점은 찾을수가 없다.
숭산은 하도 험해서 날이 좋아도 오르기가 힘드니 그냥 돌아가자는 안내인과 운전기사분의 손사래를 모르쇠하고 억지로 숭산으로 향하긴 하였으나, 숭산입구에는 약초꾼들은커녕 중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뭐라도 하나 내다놓고 팔고있는 장사꾼들 조차 보이지 않는다.
쏟아지는 비를 우산으로 막느라 숭산의 기세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보기에도 험한 저 돌산을 오르기는 역시 무리겠구나. 게다가 모두들 비를 많이 맞아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몸으로는 .. 아쉬운 마음으로 차를 돌린다.
지황을 보기 위해 멀리도 떠나온 여행이었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회우슬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이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란…
계획할수 있고, 예측가능한 일들이 척척 벌어질때의 순조로움 보다는 오히려 우리도 어찌할수 없는 힘에 이끌려 생기는 우연이라는 요소들에 의한 흥미진진함 그 윤택함들에 점수를 더 주는 나에게는 오히려 이런 만남이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함께 약초답사를 떠났던 본초학 교수님들, J박사님, 현지 약재공사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함께 해주셨던 D생약의 사장님, 그리고 우리일행.. 모두 조금씩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출바한 여행이었지만, 올바른 한약재를 위해서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했던 첫 발걸음이었다.